
관념적 소재 '견딤' 미학으로 이끌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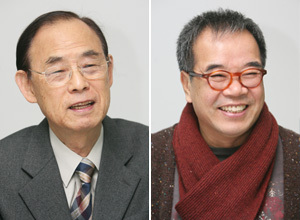
요즈음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시 쓰기가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한다. 첫째는 광야에서 골리앗 장군처럼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내던 시대의 공동과녁이 유체화된 데에다, 또 하나는 그 옛날 감히 다가서지 못했던 시 쓰기의 엄위한 비의(秘義)가 이곳저곳에서 그만 해킹되고 만 것이다. 이런 때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아무 고민 없는 사적(私的) 요설이다.
이런 몇 가지를 상정하면서 조심스레 심사에 임했다. 807편을 상회하는 응모작 속에서 예심을 거쳐 우리에게 넘겨 온 작품들은 10명의 것이었다. 이 가운데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작품은 <먼지> <신발 고르는 저녁> <호후(虎侯)> 등 세 편이었다. 이 세 작품은 어느 작품을 내세워도 당선작으로 손색이 없으리만치 수준이 가즈런하나, 규정에 따라 고심 끝에 <먼지> 를 택하였다.
<신발 고르는 저녁> 은 세차원인 '쑤안'(이주여성)이 파장에 신발을 고르는 모습을 통해 그려낸 인간애가 눈물겹기만 한 작품이다. 그러나 심사자는 응모자를 바라봐야지 시 속의 '쑤안'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냉정 때문에, 그리고 화살이 빗나간 날들의 변두리에 박힐 때마다 손가락질이나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녁으로 서보라는 <호후(虎侯)> 역시 시대의 정곡을 찌르는 훌륭한 작품이나 아무래도 주제의 깊이에서 <먼지> 에 밀릴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크다.
당선작 <먼지> 는 한 주제를 가지고 세 편으로 나눈 일종의 연작시 형태를 취하고 있는바 신춘문예 응모작으로는 대단히 모험적인 기법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 작품은 내적으로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작품 속의 하찮은 <먼지> 는 화자 자신, 나아가 우리 인간존재의 등가물로서 내밀한 삶과 그 가치를 성찰하고 긍정코자 한 시도로 이해된다. '1. 무게'에서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먼지'처럼 버리고 비우며 가뿐하게 사는 소박한 모습을 통해 가진 자들의 욕망에 대한 반성을 꾀하였고 '2. 높이' 역시 고단한 삶을 견뎌내게 하는 힘은, 바로 내일이라는 희망에 물꼬를 대고 있다. 특히 "먼지도 세월을 견디며 높이를 갖는구나"라는 아포리즘적인 시행이 두 심사자의 눈길을 오래 머물게 하였다. '3. 길'은 쌓였다가 깎였다가 하면서 오랜 시간 존재해온 '먼지'와 그들이 걸어온 '길'을 통해 무한한 시간 속에서의 부단한 자기 성찰을 드러내려 한 작품으로 속도감 있는 운율이 돋보인다.
그리고 '방구석→차 안→허공→우주'로 확대되는 공간배치의 기법도 탁월하다. 자칫 관념으로 떨어지기 쉬운 소재를 끝내 작은 것들의 '견딤'의 미학으로 이끈 것은 오랜 동안의 습작의 뒷받침이 아닌가 싶다.
요즈음 시인은 많으나 시가 없다라든가 아니면 시는 지천으로 흐드러지는데 정작 시인이 안보인다 라는 말을 뒤집어보면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된다. 금번 최종심으로 넘어온 10명의 응모작들은 그 궁핍증을 덜어주는데 족히 일조가 될 만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노들강변으로 널려 있는 등단길을 외면한 채 연마에만 몰두해온데 대해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러므로 낙심은 금물, 응모자 제위의 행운을 빌어마지 않는다.
/허소라(시인) 김용택(시인)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