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독 자양분 삼아 詩로 승화시켰다
 |
||
| ▲ 시선집 '흘러' | ||
지난 28일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김동수 시인(66·백제예술대 교수) 정년 퇴임식. 태풍'볼라벤'이 전북을 할퀴고 간 을씨년스러운 날씨였으나 전국의 제자들은 '목숨 걸고' 이곳을 찾았다. 백제예술대는 학교 발전에 공헌한 시인에게 시선집'흘러'(Inter being·백제예술대)를 헌정했다. 눈물까지는 아니어도, 누구라도 감동해 고개를 주억거릴 법한 이 분위기에 그러나 시인은 퇴임사를 밝히며 어깃장을 놓았다. 이날 제자들이 그의 대표작을 낭송한 것을 두고 "내 마음을 온전히 읽어주질 못한다"는 푸념이었다.
"아마도 전생에 내가 옥황상제의 아들이나 됐는데, 무슨 말썽을 일으켜서 하늘로 내려온 게 아닌가 싶어. 평생 이방인으로 살게끔. 참 외로워."
시인을 아는 지인들은 '그러려니…'하는 얼굴로 대꾸했다. 툴툴대는 시인이 싫지 않은 기색이었다. '응당 어른이라면 이래야 한다'는 체면을 벗어던지고 사는 시인은, 그래서 좀체 늙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시인의 본분은 맨살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자양분 삼아 성찰의 시편과 문장을 빚어내는 것. 그는 가난으로 인한 방황과 결핍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젊음을 시인의 언어로 고백해왔다. 가끔 술잔을 기울이며 털어놓는 속 얘기는 '고독이야 말로 시인의 양식이고 뮤즈'라는 말을 연상시켰다. 그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오하근 원광대 명예교수는 '병상의 아버지 대신 집안을 꾸리기 위해 교육대학에 진학해 산골과 외진 섬에 초·중·고 교사로 시작해 대학교수로 정년을 맞았다'면서 '그간에 시인이 되어 있었고, 못다한 학업에 대한 집념으로 대학원까지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니 그 고초야 어떠했으랴'라고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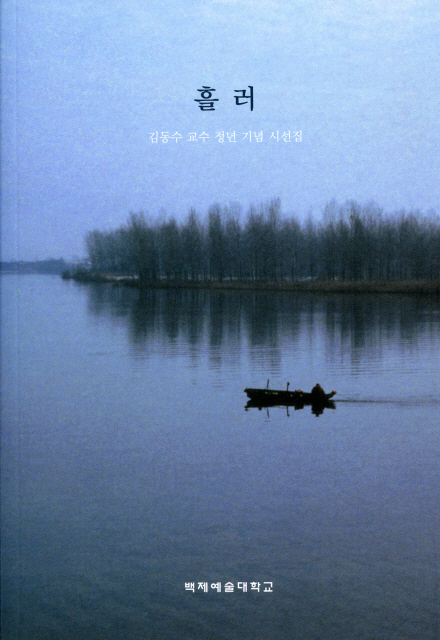 |
||
'나의 시는 / 내 영혼의 사당 // 그 속에 / 전생의 내가 들어있다 // 뱀이 이브를 꼬여내기 전 // 새끼 새 한마리 / 숲속을 종종거리고 // 무리에서 낙오된 / 말 한 마리 // 바이칼호의 밤하늘에서 / 홀로 빛나던 // 나의 시는 / 전생에 두고 온 내 영혼의 푸른 눈망울이다.' ('나의 시' 중에서)
시인은 종종 "시는 현실이 아니라 꿈이기에 늘 외로웠다"면서 "내 전생에 두고온 내 영혼의 사당을 찾아다니는 것 같다"고 했다.
빠른 시간과 속도 속으로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는 시대. 그의 시편들은 그 속도와 시간에 저항하며 실존적 존재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여기서 파생된 고독은 시 창작의 불쏘시개가 되어 정갈한 말의 무늬로 일렁이는 우리의 마음을 위무해준다.
시인은 뭐든 연연해하지 않는다. 설사 시간이 험한 상처를 남긴다 해도 날씨 좋을 때 찾아주는 인연이 있고, 비록 절망에 빠지더라도 족쇄에 차이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면 삶은 그 소명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가을의 무늬는 이렇게 새겨지고 있다.
남원 출생으로 전주대 국어교육과, 원광대 대학원 석·박사과정을 졸업한 시인은 (사)한국미래문학연구원장·전국대학 문예창작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홈
홈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