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늦깎이 시인의 첫 시집⋯"‘첫’이란 말과 마주 앉아 눈물겨워"

김이담 시인이 첫 시집<그 벽을 껴안았다>(애지)를 발간했다.
“튀어 오르겠어/어떤 목적도 방향도 애초 필요 없어/부딪히는 거야 넘어지면 어때/무릎 깨져 찌그러지면 잠시/주저앉았다가 바람 불어가는 쪽으로/날아가는 거야 낭떠러지 만나면/뛰어내리고 바위는 뛰어넘는 거야/상처는 상처로 동여매고/튕겨져 보는 거야/우리에게 변방은 없어/뿌리 닿는 곳이 나의 제국/몸의 알람브라 궁전을 세우는 거야” (시‘민들레처럼’ 전문)
시집은 ‘제1부 뜬 눈의 수천 손들’, ‘제2부 푸른 그늘을 펼쳐드는’, ‘제3부 햇살이 쓸고 가는’, ‘제4부 귀 낮은 풀벌레 소리’, 등 총 4부로 구성됐으며, 60편의 시가 담겨 있다. 시집은 김 시인의 언어 감각과 밀도 깊은 상상력이 담겨 있는 동시에 설움과 눈물 등 인간의 삶에 드리워진 아픔까지 녹여내고 있다.
시인은 “나는 배가 고파 노동 현장에 뛰어들어야 했지만 돌고 돌아 ‘첫’이란 말과 마주 앉아 눈물겹다”라며 늦깎이로 첫 시집을 출간하는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가난하고 쓸쓸한 우리 사회의 변두리 사람들, 그러나 결코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이 땅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었다”며 “자본이 아닌 자연에서 그들의 삶을 투영해 때로는 의미를 배제한 자연 그 자체의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다. 그것을 독자들과 함께 다시 자연에서 배우고 복원해 옛사람들처럼 서로 기대 사는 삶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흥진 평론가는 해설을 통해 “김이담 시인의 시는 사물 속에서 자연의 오롯한 이치를 발견하는 시심과 그것을 가로막는 삶의 비애 사이에서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다”며 “시인의 자본을 사유하는 시 정신과 약자들을 발견하는 사랑의 시 정신에 주목하게 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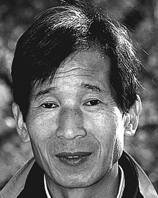
한편 김 시인은 충북 보은 출신으로 지난 2019년 계간 <가온문학> 봄호에 ‘그 바다의 뒷모습’ 등을 발표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해 <동맥문학> 시대를 지나 <그릴문학>, <천수문학>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