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준호 교수, 문장의 발견] 그런 말도 안 되는 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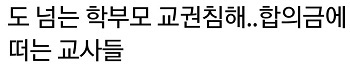
그 시절에는 학교 다니면서 참 많이도 맞았다. ‘국민학교’ 때부터 그랬다. 학급 성적이 꼴찌라고 담임선생님한테 단체로 맞았다. 지난달보다 떨어진 점수만큼 엉덩이나 손바닥을 때린 선생님도 있었다. 심지어 선배들이 몽둥이를 휘두르기도 했다. 엉덩이에 피멍이 들었어도 집에 가서 맞았다는 말은 뻥끗도 하지 못했다. 오죽 잘못했으면 때렸겠느냐면서 아버지한테 추가로 맞을 게 뻔했기 때문이다. 친구하고 놀다가 다쳐도 웬만해서는 그냥 넘어가곤 했다.
‘도 넘는 학부모 교권침해, 합의금에 떠는 교사들’이라는 제목의 신문기사를 보았다. 전학한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적응을 잘 못하는 것은 전에 다니던 학교 담임이 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에게 합의금 300만원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어느 교사의 우울하기 짝없는 사연이 그 기사에 담겨 있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발령을 받아 1학년 3반 담임을 맡았다. 그때가 겨우 스물네 살이었으니 말 그대로 애가 애들을 가르친 셈이었다. 어느 날 반 아이 하나가 점심시간에 친구하고 장난을 치다가 넘어져서 입술이 깨지고 앞니 두 대가 부러지는 엄청난 사고를 당했다. 눈앞이 캄캄했다. 그 아이를 근처 병원으로 데려가 응급조치를 했지만 부러진 이까지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아이를 조퇴시킨 나는 오후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안절부절 못했다. 그런데 청소시간에 교무실로 아이의 엄마가 전화를 걸어왔다.
“선생님이 얼마나 걱정하실까 염려돼서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염려마세요.” 물론 30년도 훨씬 지난, 혹은 30년 정도밖에 안 된 옛날 얘기다. 그래도 새삼 돌이켜보니, 참, 어쩌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시절이 다 있었는지 모르겠다.
송준호 교수, 문장의 발견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자메시지는 힘이 세다 참 잘 둔 친구 하나 야냥개를 떨어요 먹을 때 제일 예쁜 여친 이미례 여사 고르면 고를 수 있다 화암사에 한번 가보라고 고독이 몸부림 칠 때 어느 북적거리는 페스티벌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