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곤 시집 『시장에 나가보면 싼시 짠시가 널려있다』를 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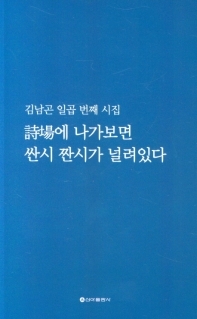
시(詩)는 어떻게 사는가. 문명이 내민 현란한 스펙트럼의 적자로 사는가. 사람을 점점 잃어가는 세태에 거리를 두고 서정의 영토를 개간하며 사는가. 아니면 자신의 존재감을 ‘숯먹’(「돌꽃」)으로 갈아서 빛내며 사는가.
김남곤의 일곱 번째 시집 『시장에 나가보면 싼시 짠시가 널려있다』를 읽고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시인의 몸에 적힌 일상을 억지로 재해석하지 않는 시편들은 단지 창작물에 그치지 않고 생명체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던 것이다. 길섶에 핀 민들레 한 송이처럼 시(詩) 또한 자신만의 옷을 입고 인간의 시간 바깥에서 나부끼는 셈이다.
삶의 현재를 걸림새 없이 써내려 간 김남곤의 시편들은 토박이말과 우리말을 버무리는데 능숙하다. 시인도 세월을 이겨 먹을 수 없어서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는”(「하모니카」) 입장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오늘에도 “이슬 따먹기 좋게 환해 보이”(「거리두기」)는 봄날을 얻고, 인간사에 편입된 ‘던적스러운’(「간치러 간다」) 것들을 엄히 꾸짖고 싶은 욕망을 지나, “좁으장한 마당귀”와 “미루적거리는 내 그림자”(「고산면을 지나며」)를 살뜰하게 보여준다.
오늘이 잃은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는 듯 막사발은 저녁 밥상에서 ‘자그락거렸’(「막사발」)고, 어린이의 손을 보고싶어서 ‘코쭝배기’(「애기똥풀」)를 데려오고 싶으며, 시절이 수상해서일까 “왕궁리 피 먹진 수숫대 바람”(「왕궁리 바람」)을 만나기도 한다. 누군들 그리움을 파먹고 살지 않으랴만 시인도 “눈이 번하”(「보리라」)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거나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목 꺼지게 꺼내지 못”(「죽비가 걸려 있는 풍경」)했던 때도 있었을까. 하여 “되창문을 밀치고/ 함박눈이 바작으로 빠지기”(「겨울이면」)를 바라면서 “술밥 친구”(「집, 느티나무 산조」)를 오래 기다렸을까.
언어가 물질화되다 못해 더러 무례하기까지 한 풍토에 눈비음하지 않는 그의 시학은 기억 속을 ‘들랑거’(「입동일기」)리며 시구를 입에 쩍쩍 들어붙게 한다. 어느 봄날 점심을 먹고 나서 “그럴싸했습니다.”(「어느 날 점심」)라는 넉살이며, 별똥이 “찍하고 떨어”(「공허」)진다는 해학, 대팻집 속에 감춰진 “서릿발 같은 쇳날”(「소목장(小木匠)」) 등의 어구는 단아하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여기에 ‘잔챙이가지’며 “딱 엎딘 굴뚝새집”이며 ‘됫박소금’이며 ‘딸따니’ 등의 시어들과 어구는 사람의 체취를 간직한 품성을 호출하기까지 한다. 모질게 가난했던 그 시절이 데면데면한 지금보다 삶의 정서가 훨씬 풍요로웠음을 언표하는 것이겠다.
땅에 떨어진 동백꽃을 보고 “무량의 너비”(「동백꽃 지다」)를 짐작하는 김남곤의 시편들은 품이 넓고 깊다. 시집 제목에 적힌 “싼시 짠시” 즉 싱거운 시와 짱짱한 시를 차별하고 싶은 생각이 없음은 물론 문명의 이중성에 시달리는 사람들까지 존중하고 싶다. 그러므로 승속을 아우르는 김남곤의 시편들은 존재한다. 그가 선택한 시어들이 운율과 어울려 빚어내는 메타의 생명력은 시(詩)의 ‘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인색하지 않다. 시인이 꽃이름을 ‘피다지다꽃’(「피다지다꽃」)으로 명명하듯 앞으로도 그의 시편들은 토박이말과 우리말 속에 간직된 한국적 정서를 토대로 자신만의 시의 영토를 넓혀갈 터이다. /이병초(시인, 웅지세무대 교수)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